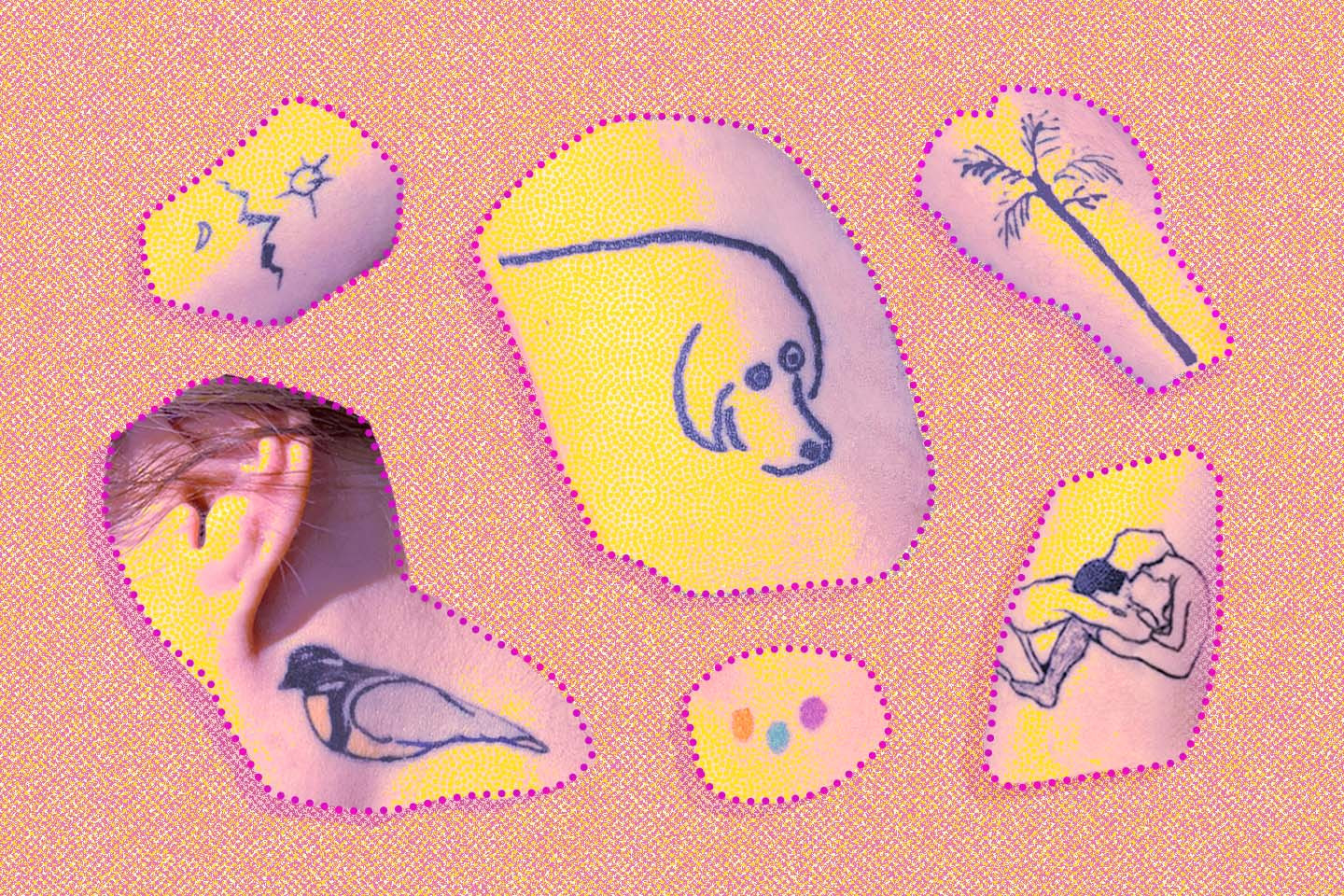추천 콘텐츠
2003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타투 스쿨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그곳에 타투를 배우러 다니는 수강생이었는데, 주말이면 그 입구 앞에 50미터 정도의 긴 줄이 생겼다. 타투와 피어싱 시술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흑인, 백인, 동양인, 라틴계 사람 등 다양한 피부색이 어우러져
시술을 기다리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을 특정 직업군에서만 볼 수 있었던 터라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충격을 받았다. 손에 10달러짜리 지폐를 말아서 꼭 쥐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아마추어 타투이스트에게 시술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한국에서라면 교육생에게 시술받는 조건으로 타투 가격을 할인해 준다 해도 많은 고객이 기피했을 텐데 말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투를 받고 싶다는 생각들인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두가 들뜬 표정이었다. 심지어 한 흑인 여성은 가슴에 작은 타투를 해주자 울기 시작했다. ‘혹시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왜 우는지를 물어봤다. 그 여성의 대답은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타투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울리기까지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채, 한 달간의 타투 교육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책의 부제 중 ‘합법화되지 못한 타투’라는 개념은 사실 틀렸다.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990년대 미국 뉴욕시가 공중위생상의 문제로 타투 시술을 금지했던 것처럼 과거 외국에서 타투가 불법이던 사례는 꽤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들다. 불법과 합법 이전에 타투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나라, ‘문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게 언뜻 당연해 보인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들이 하는 건 불법이다. 이후 논란에 휩싸이자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 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 했다.
그렇다면 의료인은 누구인가? 의료법 2조에 의거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과 보건복지부 측은 간호사의 타투 시술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모든 타투 시술은 불법이며, 의사가 하는 타투 시술만이 합법이다. 일반인은 물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많이들 모르는 부분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온 퍼포먼스가 대중들에게 큰 논란이 됐다. 한쪽에선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시대정신이 타투의 합법화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다른 한쪽에선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타투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타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만 네 건이다. 타투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30년 전 판례에 갇힌 타투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1]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0대의 26.9퍼센트가 타투 시술 유경험자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5.5퍼센트가 타투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조사 당시 기준 최근 1년 내에 시술받은 비율이 45퍼센트가 넘는다.
시술을 기다리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을 특정 직업군에서만 볼 수 있었던 터라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충격을 받았다. 손에 10달러짜리 지폐를 말아서 꼭 쥐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아마추어 타투이스트에게 시술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한국에서라면 교육생에게 시술받는 조건으로 타투 가격을 할인해 준다 해도 많은 고객이 기피했을 텐데 말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투를 받고 싶다는 생각들인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두가 들뜬 표정이었다. 심지어 한 흑인 여성은 가슴에 작은 타투를 해주자 울기 시작했다. ‘혹시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왜 우는지를 물어봤다. 그 여성의 대답은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타투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울리기까지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채, 한 달간의 타투 교육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책의 부제 중 ‘합법화되지 못한 타투’라는 개념은 사실 틀렸다.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990년대 미국 뉴욕시가 공중위생상의 문제로 타투 시술을 금지했던 것처럼 과거 외국에서 타투가 불법이던 사례는 꽤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들다. 불법과 합법 이전에 타투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나라, ‘문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게 언뜻 당연해 보인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들이 하는 건 불법이다. 이후 논란에 휩싸이자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 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 했다.
그렇다면 의료인은 누구인가? 의료법 2조에 의거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과 보건복지부 측은 간호사의 타투 시술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모든 타투 시술은 불법이며, 의사가 하는 타투 시술만이 합법이다. 일반인은 물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많이들 모르는 부분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온 퍼포먼스가 대중들에게 큰 논란이 됐다. 한쪽에선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시대정신이 타투의 합법화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다른 한쪽에선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타투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타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만 네 건이다. 타투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30년 전 판례에 갇힌 타투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1]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0대의 26.9퍼센트가 타투 시술 유경험자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5.5퍼센트가 타투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조사 당시 기준 최근 1년 내에 시술받은 비율이 45퍼센트가 넘는다.
문신 및 반영구 화장 경험
| 연령 | 사례 수 | 문신 | 반영구 화장 | 경험 없음 |
| 10대 | 99건 | 7.4% | 14.9% | 81.8% |
| 20대 | 228건 | 26.9% | 37.9% | 48.4% |
| 30대 | 287건 | 25.5% | 37.6% | 47.2% |
| 40대 | 219건 | 14.9% | 35.3% | 55.1% |
| 50대 이상 | 167건 | 8.8% | 25.4% | 65.2% |
굳이 어려운 학술 자료로 말할 필요도 없다. 여름날 길거리에 나서면 팔뚝에 크고 작은 그림을 새긴 젊은 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말이다. 홍대, 이태원, 성수동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은 자연스럽다. 타투는 더 이상 소수만이 비밀리에 즐기는 취향 혹은 특정 신분
이나 직업군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타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반면 타투에 대한 논의는 어떤가? 방송에선 아직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타투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한다. 마치 TV 속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하는 것과 같은 어색함이 느껴진다. 끽연처럼 타투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 연예인의 어깨에 새겨진 문양이 어린이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 주고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가? 우리 병원을 방문한 고객 중 타투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몸에 새기고자 하는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긍지와 자존감을 얻는 것으로 보였다.
타투가 합법화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년간 한국 타투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타투에 대한 통제와 인식을 지켜봐 온 한 의사가, 의료인과 타투이스트 양측의 입장에서 타투 합법화 논쟁의 본질을 살피고자 한다. 타투는 흔히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몸에 그림을 그려 넣는 서화 문신이다. 다른 하나는 눈썹, 입술 등에 잉크를 새겨 화장을 대체하는 반영구 화장이다. 이 책에선 서화 문신과 반영구 화장 두 가지를 통틀어 타투로 지칭함을 미리 밝힌다. 불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타투 업계 종사자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료인들, 그리고 폐쇄적인 타투 시장에서 최종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이 책이 타투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나 직업군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타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반면 타투에 대한 논의는 어떤가? 방송에선 아직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타투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한다. 마치 TV 속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하는 것과 같은 어색함이 느껴진다. 끽연처럼 타투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 연예인의 어깨에 새겨진 문양이 어린이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 주고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가? 우리 병원을 방문한 고객 중 타투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몸에 새기고자 하는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긍지와 자존감을 얻는 것으로 보였다.
타투가 합법화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년간 한국 타투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타투에 대한 통제와 인식을 지켜봐 온 한 의사가, 의료인과 타투이스트 양측의 입장에서 타투 합법화 논쟁의 본질을 살피고자 한다. 타투는 흔히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몸에 그림을 그려 넣는 서화 문신이다. 다른 하나는 눈썹, 입술 등에 잉크를 새겨 화장을 대체하는 반영구 화장이다. 이 책에선 서화 문신과 반영구 화장 두 가지를 통틀어 타투로 지칭함을 미리 밝힌다. 불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타투 업계 종사자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료인들, 그리고 폐쇄적인 타투 시장에서 최종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이 책이 타투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1]
[1] 김대중·최은진·권진·심정묘·김보은,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